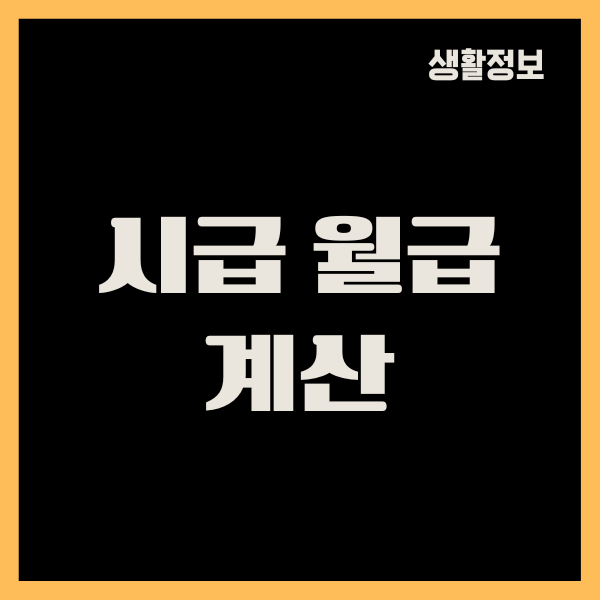예전엔 월급명세서에 관심이 1도 없었어요.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오면 ‘월급 들어왔네~’ 하고 끝이었죠. 그런데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, 프리랜서로 단기 계약직도 해보다 보니 이제는 진짜 월급 계산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, 최저시급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건지, 임금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 직접 따져보게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.
이번 글은 제가 처음 시급으로 일할 때 얼마나 헤맸는지, 또 월급이랑 연봉, 실수령액까지 헷갈리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대한 ‘찐’ 경험담이에요. 혹시 저처럼 계산에 약하거나 급여 관련해서 답답했던 분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
시급으로 일한 첫 직장, 계산의 늪에 빠지다
제가 처음으로 시급으로 일했던 건 40대 초반에 잠깐 마트에서 단기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였어요. 주 5일 하루 6시간, 시급은 9,620원이었죠. 그냥 단순계산으로 6시간 x 9,620원 x 20일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, 막상 첫 달 월급을 받고 나니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.
“왜 이 금액밖에 안 되지?” 머릿속이 복잡했죠. 일한 날도 정확하고 시급도 그대로인데, 통장에 찍힌 건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.
그때부터 계산기 들고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어요. 주휴수당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요.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붙는다는 사실도 인터넷 뒤적이다가 알게 됐어요.
최저시급은 그냥 숫자가 아니었더라
2024년 최저시급이 9,860원으로 바뀌었잖아요. 처음엔 ‘올랐네~’ 하고 말았는데요, 막상 시급으로 계약할 때 최저임금 이하로 계약하려는 곳도 있더라고요.
한 번은 어떤 온라인업체에서 원고 작성 알바 제안을 받았는데, 한 글 작성당 1,200원이라는 거예요. 시간으로 계산하니 한 시간에 두 개 정도 써야 겨우 2,400원.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.
그때부터는 아예 제 기준을 세웠어요. 내가 일하는 시간이 명확하다면 최저시급은 기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. 예전엔 그냥 ‘어차피 단기니까’ 하고 넘어갔던 걸 이젠 꼼꼼히 확인하게 됐어요.
월급제 전환 후 또다시 혼란
시급으로 일하던 시절을 지나, 운 좋게 계약직 월급제로 일하게 됐어요. 그때 또 한 번 멘붕이 왔던 게 ‘월급이 연봉으로 치면 얼마야?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적지?’였어요.
계약서엔 연봉 2,400만원이라 되어 있었고, 월급은 2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수령액은 18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. “어? 뭐지? 세금이 이렇게 많다고?”
결국 네이버에 ‘연봉 실수령액 계산기’ 찾아서 매달 확인했어요. 소득세, 주민세, 건강보험, 국민연금… 이거 다 빠지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꽤 줄더라고요.
회사에서는 늘 “연봉 2,400이면 괜찮지 않냐” 하는데, 실질적으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나니 생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했어요.
연봉 3,000도 실수령은 생각보다 낮다
나중에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면서 연봉 3,000까지는 올라갔는데, 진짜 문제는 4대보험을 내가 다 내야 하는 구조였어요.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니까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고,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야 했고요.
그때 느꼈어요.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실수령액이 진짜라는 거.
정말 충격적이었던 건, 연봉 3,000이면 매달 250만원쯤 손에 쥘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은 200만원도 못 되는 거예요. 연말정산에서 한 번에 내는 세금도 생각보다 많았고요.
그래서 저는 지금도 무슨 제안이 오면 꼭 물어봐요. “실수령액이 얼마예요?”하고요. 괜히 숫자만 크면 뭐하냐고요.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.
시급에서 월급 계산할 때 썼던 내 방식
제가 시급으로 다시 단기 알바할 때는 이제는 아예 자동계산기를 써요. 네이버에 ‘시급 월급 계산기’ 치면 간단하게 나오거든요.
예를 들어 시급 9,8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, 주휴수당 포함해서 대략 2,060,320원이 나와요. 여기에 세금 빠지면 실수령액은 약간 줄겠죠.
이렇게 숫자로 정확히 나와버리면 애매한 계산도 덜하게 되고, 사장님이랑 얘기할 때도 덜 불편해요. “저 이 조건이면 월 얼마 정도 될까요?”라고 물어볼 때 좀 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.
진짜 예전엔 ‘이거 말 꺼내면 까다롭게 볼까봐’ 걱정했는데, 지금은 정확히 따지고 설명하는 게 오히려 서로 깔끔하더라고요.
직장인들도 실수령액 꼭 챙겨야 해요
회사 다니는 분들은 어차피 자동으로 월급 들어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요, 특히 연봉으로 계약한 분들일수록 실수령액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
저는 연말에 보너스 포함한 금액이 전체 연봉에 합산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서 다음 해에 월급에서 더 빠지더라고요. 그게 예상이 안 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.
그 이후로는 1월마다 실수령액 다시 계산하고, 인상된 4대보험료 반영해서 가계부 예산도 다시 짜요. 그게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주거든요.
시급, 월급, 연봉 헷갈리면 이 기준만 생각하세요
-
시급으로 일할 땐 주휴수당 포함해서 ‘최저시급’이 지켜지는지 꼭 확인
-
월급 받으면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나 고정지출 계획 세우기
-
연봉 제안 받을 땐 실수령액으로 환산해서 내가 실제로 쓰는 돈 계산하기
이렇게 세 가지만 머리에 넣고 있으면 급여 관련해서 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.
예전엔 ‘돈 얘기하는 거 좀 눈치 보인다’ 싶었는데, 지금은 정확한 숫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거, 당연한 거잖아요?
마무리하며
급여는 숫자로 보이지만, 사실 내 삶의 리듬이 담긴 현실이에요. 시급이든 월급이든, 숫자 하나하나가 모여 내가 매달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니까요.
정확히 알고 따져보고, 실수령액까지 체크하는 게 귀찮을 수 있지만, 그만큼 손해도 줄고 계획도 명확해져요.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,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려요.
한 줄 요약
“시급이든 월급이든, 숫자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실수령액이에요!”